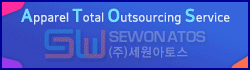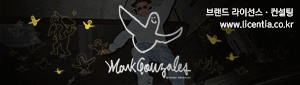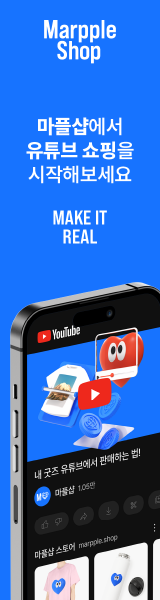
기자의 창 - 핸드백은 어쩌다 백화점의 천덕꾸러기가 되었나
발행 2017년 03월 31일
박해영기자 , envy007@apparelnews.co.kr
 이번 MD 개편에서 롯데는 본점의 14개 핸드백, 입점 브랜드의 40%에 철수 통보를 내렸다.
이번 MD 개편에서 롯데는 본점의 14개 핸드백, 입점 브랜드의 40%에 철수 통보를 내렸다.
이후 롯데 소공동 본사 문턱이 닳을 정도로 핸드백 업체 회장부터 사장 그리고 해외 본사 임원들까지 방문하며 본점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일부는 핸드백 PC에서 쫓겨나 의류층으로 옮겼고 일부는 자사가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로 대체하는 쪽으로 마무리 됐다. 최종적으로 통보 받은 브랜드의 40% 정도는 연명할 수 있게 됐다. 상황은 어느 정도 무마 됐지만 어쩌다 핸드백 PC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 제작비 마저 높은 핸드백이 10년 넘게 고수수료까지 떼어주고도 말이다.
핸드백 수수료는 평균 38%로 백화점 패션 카테고리 중 선글라스를 제외하고 가장 높다. 일반 패션 군과 4~10%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핸드백 시장은 과거 LF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이 중소형 규모였고 획일화된 유통 환경에 높은 가격대 때문에 90% 이상의 브랜드가 100% 백화점 유통에 의존해왔다. 자연히 백화점은 핸드백 업체들에게는‘ 갑중의 갑’이었다.
‘엠씨엠’은 롯데 본점에서 연매출 220억원을 돌파했고 상위권에서 3~4억원대 매출은 명함도 못 내밀던 시절도 있었다. 평당 최고 효율에 수수료까지 높으니 융숭한 대접을 받은 시절이었다. 물론 한 브랜드는 혜택도 받았다.‘ 엠씨엠’은 명품 존까지 입성했다.
3년 전부터 가죽부터 원부자재 가격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타더니 소비심리 마저 격하게 얼어붙으면서 핸드백 브랜드는 도전보다는 안전지향형 제품을 쏟아 냈다. 결국 고객이 돌아섰다. 전성기에 목소리도 내지 못했고 자승자박이라는 지적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유통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롯데의 이번 이슈에대해 관계자들은 이번 발상은 전 대표의 작품이라며 입점 된 전브랜드를 대상으로 신장률 하위 30%를 칼질 하라는 데서 비롯됐다는 입을 모은다. 공교롭게도 아웃도어와 핸드백의 역신장폭이 커 희생양이 많았던 상황.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들 브랜드 중 월 1억원대 브랜드도 상당수 있다. 사실 이는 바이어가 아닌 어카운턴트(경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더욱이 PC를 가장 잘 아는 바이어의 결정을 무시하고 실무에서 가장 거리가 먼 높은 자리에서 상명하달 식 MD를 한다면 더 큰 문제다.
요즘 들어 백화점은 오로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매출 숫자만 체크한다. 전략과 전술은 물론 대안도 없는 MD로 퇴보했다.
이번 롯데 본점도 결국 핸드백이 나간 자리를 중저가 브랜드와 요우커를 위한 코스메틱으로 채웠다. 일부는 대안 브랜드도 못 찾고 장기 팝업을 운영 중이다. 다른 유통도 마찬가지다.
핸드백에 이어 다른 PC도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유통의 미래는 없다. 브랜드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인큐베이팅은 유통의 숙명이기도 하다.
기다림의 미학이 때론 살벌한 비즈니스 세계에도 필요한 법이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g)
.gif)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1 스포츠 아웃도어, 성장기 지나 성숙기 진입
- 2 이마트, 죽전점 시작으로 업태 전환 속도
- 3 룰루레몬과 리바이스...실적 거스르는 ‘희비’ 왜?
- 4 레인부츠로 대박 낸 신발 업체, 영역 확장
- 5 푸마, 백화점 등 직접 리테일 전환
- 6 김진용 전 모던웍스 대표, 퓨쳐웍스 설립
- 7 세아상역, 美 스포츠 의류 제조사 ‘테크라’ 인수
- 8 여성복, 올 여름 승부처는 ‘데님’
- 9 제강 회사가 만든 리얼 워크웨어 ‘아커드’ 런칭
- 10 롯데GFR, 패션 전문 조직 정비 완료
- 11 올버즈에 대한 경고 ‘주가 1달러 이상으로 올려라’
- 12 메디쿼터스, 320억 투자 유치…기업가치 2800억
- 13 머렐, ‘하이드로’ 필두로 신발 시장 공략
- 14 패스트리테일링 반기 실적, ‘일·중 저조, 미주·유럽이 견인’
- 15 ‘어나더오피스’ 제품력 앞세워 일본 시장 정조준
- 16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
- 17 F&F, 제주 해양 폐플라스틱 의류로 재탄생
- 18 ‘판도라핏’ 오프라인 전용 PDRF 라인 전개
- 19 어센틱이 인수한 英 ‘테드 베이커’ 다시 매물로
- 20 ‘닥스 맨’, 정체성 강화
구인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