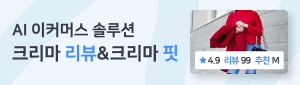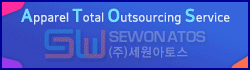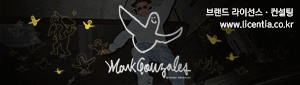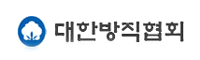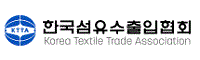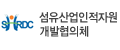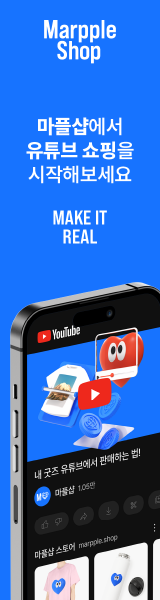
[정영진] 사전증여와 상속세 계산법
발행 2023년 07월 03일
어패럴뉴스 , appnews@apparelnews.co.kr
정영진의 ‘세법(稅法) 이야기’
 |
| 정영진 양천세무서 재산조사팀장 |
김병만 씨는 “길어야 3개월”이라는 의사의 말에 가슴이 먹먹하다. 일찍 독립해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장남에게는 그동안 목돈을 서너 번 보내줘서 미안할 게 없고, 둘째 딸은 외국 유학과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하라며 큰돈을 줘 아쉬울 게 없지만, 백수로 빈둥거리고 있는 막내가 걱정이다.
재산을 계산해보니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 7억 원, 은행 예금 5억 원,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18억 원 등 약 30억 원이다. 고심 끝에 아파트(7억 원)와 예금 1억 원은 아내 박순덕에게, 예금 2억 원은 막내 김병수에게 증여했다. 박순덕은 증여세 3천만 원⑴을, 김병수는 증여세 2천만 원⑵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했다.
장남 김병호 씨와 둘째 김해진 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정리하면서 아버지 계좌에 예금과 주식 20억 원이 있다는 것과 석 달 전 집과 예금 3억 원을 어머니와 막내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다. 만약 사전에 증여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 간 분할 협의로 어머니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과 동일한 8억 원이 실제 상속된다면 배우자상속공제 8억 원⑶이 공제돼 상속세를 4억4천만 원⑷만 내면 되는 데 반해, 어머니에게 이미 8억 원이 증여됐으므로 어머니를 제외하고 자식들만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이 기본공제액인 5억 원에 불과해 상속세를 5억1천만 원⑸이나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어머니와 막내 증여세 납부액 5천만 원을 더하면 총 부담 세금이 5억6천만 원으로 사전증여로 인한 세금 차이는 1억2천만 원에 달한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으니 현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 어머니에게 사전 증여된 8억 원은 그대로 두고 상속재산 20억 원 중 6억 원을 어머니가, 나머지 14억 원을 자식들이 상속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이 5억 원에서 6억 원⑹으로 늘어나 상속세를 4천만 원(추가공제 1억 원의 세율 40%)을 절세할 수 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6억 원을 상속받도록 하고, 나머지 14억 원을 나누어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를 제외하고 나눌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위 사전증여에 대한 상속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1) [증여세 3천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 2억 원(증여재산가액 8억 원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 x 세율 20% - 누진공제액 1천만 원(신고세액공제 3%인 90만 원을 차감하여야 하나 계산 편의상 생략함. 이하 같음)
(2) [증여세 2천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 1.5억 원(증여재산가액 2억 원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 원) x 세율 20% - 누진공제액 1천만 원
(3) [배우자상속공제 8억 원]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10억 원 = 30억 원 x 3/9)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
(4) [상속세 4.4억 원] = 상속세 과제표준 15억 원(상속재산가액 3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8억 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 원) x 세율 40% - 누진공제액 1.6억 원
(5) [상속세 5.1억 원] = 상속세 과세표준 18억 원(상속재산가액 20억 원 + 사전증여재산가산액 10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5억 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2억 원) x 세율 40% - 누진공제액 1.6억 원 – 증여세액공제 0.5억 원
(6) [배우자 상속공제액 6억 원] = 6.6억 원(상속재산 20억 원 x 어머니 법정상속분 3/9)이 아니라 6억 원이 이유는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 때문이다. 한도액 6억 원은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0억 원) x 배우자 법정상속분 3/9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4억 원으로 계산된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g)
.gif)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1 가두 볼륨 여성복의 희비…인동·신원·세정 '선방'
- 2 패션 중견사, 자사몰 육성 속도 낸다
- 3 이랜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영 속도
- 4 ‘K2’의 프로덕트 전략, 연이어 히트
- 5 에스제이그룹, ‘올해부터가 본 게임’
- 6 핵심 상권 주간 리포트
- 7 극강의 체온조절 소재 ‘아웃라스트’ 한국 상륙
- 8 ‘와릿이즌’ 카테고리 다각화
- 9 코오롱FnC, ‘글로벌ㆍ내실ㆍ지속가능’에 주력
- 10 아키클래식 성수동 사옥 마련
- 11 '바스통', 백화점 입점 추진
- 12 [박현준] 성심당, 기본에 충실하기
- 13 여성 전문 데님 ‘플로우진’ 본격 전개
- 14 리스트 인덱스, 1분기 가장 핫한 브랜드는 ‘미우미우’
- 15 ‘아워파스’, 국내외 동시 공략
- 16 막스까르띠지오, 백화점 영업 본격화
- 17 ‘마뗑킴’, 홍콩·마카오·대만 1615억 규모 매출 계약
- 18 볼란테, 더 현대 판교 팝업 오픈
- 19 다이나핏, ‘트레일 러닝화’ 2종 출시
- 20 코오롱FnC, ‘수선 서비스’ 온라인으로 확장
구인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