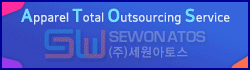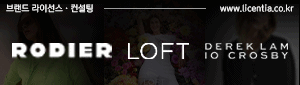이찌라의 ‘기업 읽어 드립니다’
 |
| 휠라홀딩스 사옥 |
현재 휠라홀딩스를 이끌고 있는 윤윤수 회장은 상사맨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JC페니는 당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백화점 체인으로, 한국지사는 의류나 액세사리를 저렴하게 매입해 미국으로 납품하고 있었다. 신입사원인 윤윤수에게 맡겨진 업무는 새로이 전자제품을 소싱하는 것. 한번은 저렴한 전자레인지 제조업체를 구해달라는 오더가 내려왔는데 이때만 해도 한국에는 전자레인지를 만드는 기업이 없었다. 윤윤수는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일본에서 전자레인지 120대를 구해다가 선풍기 제조 라인을 위장해 시찰까지 무사히 통과시켰다. 배짱과 순발력으로 수주에 성공한 후, 다행히 삼성전자는 6개월 뒤 우리 기술로 완성한 제품을 선적할 수 있었다. 낭만이 있던 시절, 윤윤수는 강한 승부욕과 도전 정신을 가진 전형적인 상사맨이었다.
이 시절 미국을 자주 오가던 윤윤수의 눈에 띄는 브랜드가 있었다. 바로, 고급 의류 브랜드 휠라였다. 1911년 고품질 니트를 만드는 공방으로 시작된 휠라는 반세기 뒤터 니트웨어 대신 스포츠 의류로 확장했고, 1973년 팝아트 감성의 F로고와 함께, 테니스웨어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보수적인 테니스복 시장에 네이비와 레드를 과감하게 사용한 휠라의 스타일은 파격적이었다. 스웨덴의 떠오르는 테니스 스타 비에른 보리가 휠라를 선택하면서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로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이후 휠라는 여러 번 손이 바뀐다. 80년대 초에는 이탈리아 화학섬유기업 스니아(SNIA BPD)가 최대 주주가 되었고, 1988년에는 다시 이탈리아의 유력한 금융그룹인 제미나가 인수한다.
윤윤수는 휠라에 매력을 느꼈고, 이 브랜드에서 신발을 만들면 북미에서 잘될 거라고 확신한다. 당시 휠라는 신발 부문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었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했다. 윤윤수는 휠라를 찾아가 제안했는데, 미국의 한 사업가가 같은 제안을 했고 라이선스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윤윤수는 바로 그 사업가 호머 알티스를 찾아가, 제작이라도 한국에서 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호머 알티스는 포지션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잡았고, 본사 및 제작사와 설계한 사업구조도 불합리했다. 윤윤수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윤윤수는 휠라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 아내를 포함한 5인으로 종합상사를 창업한다. 하지만 그의 첫 사업은 순탄치 않았고, 10년간의 월급 생활보다 훨씬 고됐다. 그런데 이때 고전하고 있던 호머 알티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채무가 잔뜩 늘어난 채로 윤윤수를 찾는다. 이탈리아 본사가 재고 과잉으로 처분한 신발 물량 1,500만 달러어치가 우회적으로 미국 시장에 흘러들면서, 덤핑 상품이 휠라의 고급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 여파로 미국 내 휠라 운동화 판매는 주춤해졌고, 브랜드 입지도 흔들렸다. 이를 들은 윤윤수는 종합상사를 막 시작한 쌍용을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하고, 한국에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대신 매출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다행히 이때 만든 휠라의 신발은 미국에서 대박이 났고, 호머 알티스와 윤윤수의 사업 역시 역전의 기회를 얻게 된다.
신발에는 관심이 없었던 휠라 본사는 신발이 전체 매출의 60%까지 올라가자 미국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싶어했다. 라이선스 체제로 운영되던 미국 사업권을 본사가 직접 회수하여 경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동시에 윤윤수에게는 휠라코리아의 사장을 맡겨 전 세계로 납품하는 신발을 제작해달라고 제안한다. 그 결과 1991년, 휠라코리아가 설립되고, 윤윤수는 연봉 160만 달러(한화로 18억 원)를 받는 초대 대표를 맡게 된다. 당시 한국에서 연봉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10명이 안 됐다. 말 그대로 샐러리맨의 신화였다.
1995년, 한국 사업은 이탈리아 본국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에 이를 정도로 성장한다. 이 시기 윤윤수 대표는 본사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전 세계 신발 공급을 사실상 총괄하게 된다. 이어 휠라그룹의 글로벌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된다.
< 저작권자 ⓒ 어패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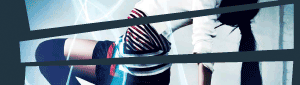





.jpg)
.gif)